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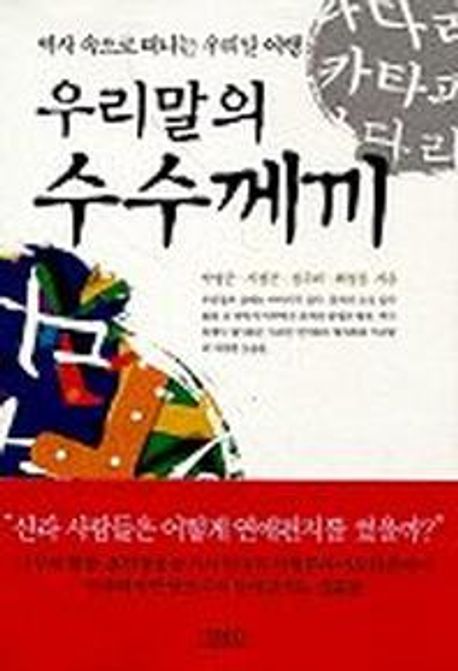
-
우리말의 수수께끼 (역사 속으로 떠나는 우리말 여행)
저자 : 박영준
출판사 : 김영사
출판년 : 2014
ISBN : 9788934909286
책소개
문자의 탄생부터 이두와 향찰, 훈민정음을 거쳐 이모티콘까지 우리말, 글과의 즐거운 만남을 주선하는 책.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우리글'하면 따분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일쑤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지은이들은 이 점에 착안, 대중적인 한글 이야기 책을 펴냈다.
소제목도 '우리 조상들은 한문 경전을 어떻게 읽었을까',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이 사용했는가', '최만리는 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을까'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16 장으로 나누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의 문자생활을 두루 살펴보았다.
또한 창제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정리해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만리의 상소문'. 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는가를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 -- 중화사상 -- 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글사용과 관련된 쟁점은,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의 역사이다. 풀어쓰기는 주시경이 제창하여 그 후학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문자정책으로 남한에서는 1954년 모아쓰기 한글간이화 방안이 작성되면서 일단락 되었다. 북한에서는 핵심적 지지자인 김두봉의 정치적 몰락과 함께 풀어쓰기 논쟁은 사라져버렸다.
최근에 와서 쟁점이 된 사안은 '로마자 표기법'.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표기법이 실제 발음과 괴리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도 컴퓨터 통신으로 활성화된 이모티콘 사용에 대해서 다뤘다.
소제목도 '우리 조상들은 한문 경전을 어떻게 읽었을까',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이 사용했는가', '최만리는 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을까'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16 장으로 나누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의 문자생활을 두루 살펴보았다.
또한 창제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정리해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만리의 상소문'. 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는가를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 -- 중화사상 -- 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글사용과 관련된 쟁점은,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의 역사이다. 풀어쓰기는 주시경이 제창하여 그 후학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문자정책으로 남한에서는 1954년 모아쓰기 한글간이화 방안이 작성되면서 일단락 되었다. 북한에서는 핵심적 지지자인 김두봉의 정치적 몰락과 함께 풀어쓰기 논쟁은 사라져버렸다.
최근에 와서 쟁점이 된 사안은 '로마자 표기법'.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표기법이 실제 발음과 괴리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도 컴퓨터 통신으로 활성화된 이모티콘 사용에 대해서 다뤘다.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문자의 탄생부터 이두와 향찰, 훈민정음을 거쳐 현대판 상형문자 이모티콘까지 우리말 우리글과의 즐겁고 유쾌한 만남
최초의 문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으로 의사표현을 했다는데 우리글의 역사에도 그런 게 있을까. 과연 어떤 형태부터 ‘우리글’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우리가 쓰는 한글은 최초의 훈민정음과 어떻게 다를까. 띄어쓰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우리글’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렇지만 숙연해지고 길이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부담스러워 하게 된다.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익숙하지만 또 가장 낯설고 알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말 우리글이다.
《우리말의 수수께끼》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국어학자 네 사람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무조건 우리말 우리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길이 보존하세’를 외치기 전에, 우리글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은 또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돌아보는 ‘우리말 역사서’이다. 대부분의 우리말 교양서들이 ‘바른말 고운말 쓰기’나 ‘재미있는 우리말 살려 쓰기’등 어휘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책은 우리말 우리글의 역사를 한눈에 돌아보고 우리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는 데서 다른 책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왜 그렇게 썼을까, 언제부터 썼을까? 익숙하지만 낯선 우리말에 던지는 질문들
만약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문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신라시대처럼 다른 나라의 글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제2의 이두 표기 시대를 산다면 로마자를 빌려 ‘live nanny die nanny, the thing-ot I problem-jay rodda.’(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쓰지 않았을까.(49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문자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해준 훈민정음은 과연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스스로 만든 것일까? 세종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처럼 완벽한 문자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나라 문자를 참조하거나 문자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7장, 111쪽)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잊고 지내기 쉬운 것이 우리말이요 우리글이다. 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우리말에 대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안다고 자부하며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말을 가장 모르고 지낸다. 마치 살아가는 데 공기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말의 수수께끼》는 이처럼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하던 우리말의 역사와 우리말 탄생의 비밀을 하나 하나 되짚어본다. 또 사람들이 으레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의문을 던져본다.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3장, 45쪽) 훈민정음은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환영받았을까?(6장, 93쪽) 지금은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모아 쓰고 있는데 왜 이중섭은 굳이 자신의 서명을 풀어서 썼을까? 왜 한글은 알파벳처럼 풀어 쓰지 않는 것일까?(12장, 207쪽)
이처럼 지나치기 쉽지만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결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의문들과 그에 대한 해답이 이 책에는 담겨 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접어두고 어쩌면 당연한 듯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 '왜 그렇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말 우리글의 참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
문자를 넘어설 시대에 바치는, 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사
저자들은 우리말에 대한 부담을 과감히 버리자고 이야기한다. 대신 우리말과 함께 뛰고 뒹굴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라 사람이 되어 시를 한 편 써 보고, 세종이 되어 최만리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논쟁도 해 보고, 독립신문을 교열하는 사람이 되어 당시의 띄어쓰기를 직접 경험할 것을 권유한다. 우리말은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거나 지겨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동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세련되고 교양 있는 말이라 생각하거나 우리말은 그저 편한대로만 쓰면 제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말 우리글 파괴가 빈번해지고 있는 시대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말과 뒹굴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할 줄도 아는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몸 부딪치며 뛰노는 사이, 독자들은 고리타분한 우리말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우리글에 스며든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이다.
최초의 문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으로 의사표현을 했다는데 우리글의 역사에도 그런 게 있을까. 과연 어떤 형태부터 ‘우리글’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우리가 쓰는 한글은 최초의 훈민정음과 어떻게 다를까. 띄어쓰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우리글’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렇지만 숙연해지고 길이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부담스러워 하게 된다.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익숙하지만 또 가장 낯설고 알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말 우리글이다.
《우리말의 수수께끼》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국어학자 네 사람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무조건 우리말 우리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길이 보존하세’를 외치기 전에, 우리글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은 또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돌아보는 ‘우리말 역사서’이다. 대부분의 우리말 교양서들이 ‘바른말 고운말 쓰기’나 ‘재미있는 우리말 살려 쓰기’등 어휘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책은 우리말 우리글의 역사를 한눈에 돌아보고 우리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는 데서 다른 책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왜 그렇게 썼을까, 언제부터 썼을까? 익숙하지만 낯선 우리말에 던지는 질문들
만약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문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신라시대처럼 다른 나라의 글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제2의 이두 표기 시대를 산다면 로마자를 빌려 ‘live nanny die nanny, the thing-ot I problem-jay rodda.’(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쓰지 않았을까.(49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문자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해준 훈민정음은 과연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스스로 만든 것일까? 세종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처럼 완벽한 문자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나라 문자를 참조하거나 문자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7장, 111쪽)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잊고 지내기 쉬운 것이 우리말이요 우리글이다. 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우리말에 대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안다고 자부하며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말을 가장 모르고 지낸다. 마치 살아가는 데 공기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말의 수수께끼》는 이처럼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하던 우리말의 역사와 우리말 탄생의 비밀을 하나 하나 되짚어본다. 또 사람들이 으레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의문을 던져본다.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3장, 45쪽) 훈민정음은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환영받았을까?(6장, 93쪽) 지금은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모아 쓰고 있는데 왜 이중섭은 굳이 자신의 서명을 풀어서 썼을까? 왜 한글은 알파벳처럼 풀어 쓰지 않는 것일까?(12장, 207쪽)
이처럼 지나치기 쉽지만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결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의문들과 그에 대한 해답이 이 책에는 담겨 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접어두고 어쩌면 당연한 듯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 '왜 그렇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말 우리글의 참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
문자를 넘어설 시대에 바치는, 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사
저자들은 우리말에 대한 부담을 과감히 버리자고 이야기한다. 대신 우리말과 함께 뛰고 뒹굴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라 사람이 되어 시를 한 편 써 보고, 세종이 되어 최만리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논쟁도 해 보고, 독립신문을 교열하는 사람이 되어 당시의 띄어쓰기를 직접 경험할 것을 권유한다. 우리말은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거나 지겨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동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세련되고 교양 있는 말이라 생각하거나 우리말은 그저 편한대로만 쓰면 제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말 우리글 파괴가 빈번해지고 있는 시대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말과 뒹굴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할 줄도 아는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몸 부딪치며 뛰노는 사이, 독자들은 고리타분한 우리말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우리글에 스며든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이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1. 문자는 왜 출현했는가
-언어 발생의 미스터리
2. 소리를 빌릴 것인가, 뜻을 빌릴 것인가
-한자와 우리말이 만났을 때
3.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을까
-갈등의 표기 역사, 이두는 정말 필요했는가
4. 사라진 언어, 신라어를 찾아서
-향찰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
5. 우리 조상들은 한문 경전을 어떻게 읽었을까
-한문에 토 달기, 구결의 역사
6.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이 사용했을까
-훈민정음과 '어린' 백성
7. 훈민정음은 다른 나라 문자를 참조했는가
-훈민정음 모방설이 나온 까닭
8. 최만리는 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을까
-집현전 학자 최만리의 철학과 사상
9. 조선시대 사람들은 ㄱ을 어떻게 읽었을까
-ㄱ에서 ㅎ까지, 한글의 순서 정하기
10. 한글은 언제부터 대중의 문자로 사랑받게 되었는가
-한글 가치의 재발견
11.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왜 만들어지게 되었나
-표기법의 혼란과 표준어의 필요성
12. 풀어 만든 글자를 모아 쓴 이유는
-풀어쓰기의 원조, 주시경의 실험
13. 외국인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를 생각할 것인가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 로마자 표기법
14. 치열한 철자법 논쟁의 진상은
-한글 전용과 한자 병용 논쟁
15. 세종대왕상을 아시나요
-인류의 지적 유산, 한글
16. 새로운 문자의 탄생인가, 과거 회귀인가
-현대판 상형문자, 시각언어
-언어 발생의 미스터리
2. 소리를 빌릴 것인가, 뜻을 빌릴 것인가
-한자와 우리말이 만났을 때
3.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을까
-갈등의 표기 역사, 이두는 정말 필요했는가
4. 사라진 언어, 신라어를 찾아서
-향찰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
5. 우리 조상들은 한문 경전을 어떻게 읽었을까
-한문에 토 달기, 구결의 역사
6.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이 사용했을까
-훈민정음과 '어린' 백성
7. 훈민정음은 다른 나라 문자를 참조했는가
-훈민정음 모방설이 나온 까닭
8. 최만리는 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을까
-집현전 학자 최만리의 철학과 사상
9. 조선시대 사람들은 ㄱ을 어떻게 읽었을까
-ㄱ에서 ㅎ까지, 한글의 순서 정하기
10. 한글은 언제부터 대중의 문자로 사랑받게 되었는가
-한글 가치의 재발견
11.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왜 만들어지게 되었나
-표기법의 혼란과 표준어의 필요성
12. 풀어 만든 글자를 모아 쓴 이유는
-풀어쓰기의 원조, 주시경의 실험
13. 외국인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를 생각할 것인가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 로마자 표기법
14. 치열한 철자법 논쟁의 진상은
-한글 전용과 한자 병용 논쟁
15. 세종대왕상을 아시나요
-인류의 지적 유산, 한글
16. 새로운 문자의 탄생인가, 과거 회귀인가
-현대판 상형문자, 시각언어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