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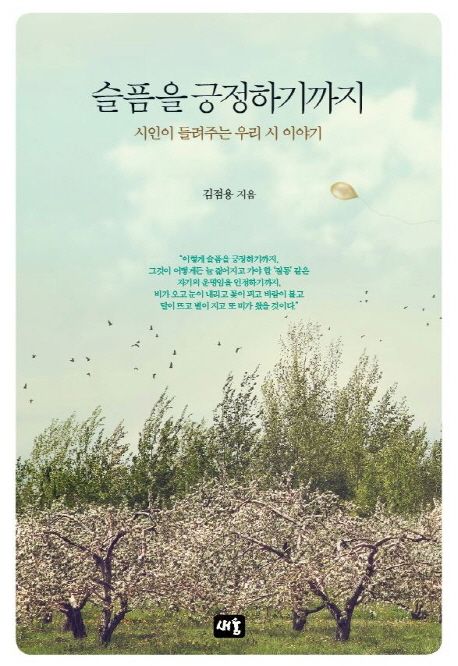
-
슬픔을 긍정하기까지 (시인이 들려주는 우리 시 이야기)
저자 : 김점용
출판사 : 새움
출판년 : 2012
ISBN : 9788993964431
책소개
시인을 위로하는 시, 우리를 어루만지는 시!
시인이 들려주는 우리 시 이야기『슬픔을 긍정하기까지』. 이 책은 저자가 2004년부터 문예지에 발표한 글들을 모은 것으로 본격적인 평문과 개별 작품 읽기, 시집 서평, 신작시 리뷰를 모두 4부로 나누어 엮어냈다. 비평가의 엄정한 안목보다 시인의 번뜩이는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시는 더 이상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먼 훗날 우리가 찾기 전까지 우리를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한다고 이야기하며, 시가 사라진 시대에 시를 쓰는 시인들이, 세상에서 버려지고도 끝없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시인들이 어디에 몸을 뉘일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시인의 고집과 비평가의 난해함을 잠시 벗어 던진 저자는 시가 사라져간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시인이 들려주는 우리 시 이야기『슬픔을 긍정하기까지』. 이 책은 저자가 2004년부터 문예지에 발표한 글들을 모은 것으로 본격적인 평문과 개별 작품 읽기, 시집 서평, 신작시 리뷰를 모두 4부로 나누어 엮어냈다. 비평가의 엄정한 안목보다 시인의 번뜩이는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시는 더 이상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먼 훗날 우리가 찾기 전까지 우리를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한다고 이야기하며, 시가 사라진 시대에 시를 쓰는 시인들이, 세상에서 버려지고도 끝없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시인들이 어디에 몸을 뉘일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시인의 고집과 비평가의 난해함을 잠시 벗어 던진 저자는 시가 사라져간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시인이자 시 평론가가 써 내려간 산문집.
시인의 고집과 비평가의 난해함을 잠시 벗어 던진, 한 중년의 사내가 시를 말한다.
시는 슬프다. 당신이 그리워서.
“지금은 사라진, 홍대 앞 카페 ‘예술가’에서 한 시인이 그랬다. 시의 시대는 갔다고.” 이 책은 위 문장으로 시작된다. 시를 들려주는 에세이가 시가 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의 출발점은 현실 직시가 아니겠는가. 시도 눈물을 머금고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트위터는 시처럼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구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각종 영상 매체는 시보다 더 쉽게 더 감각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러니 어려운 시는 더 이상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고. (김소월, 「먼 後日」 변용) 그러니까 끝끝내, 먼 훗날 당신이 찾기 전까지 시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는 것이다.
시인은 슬프다. 세상이 그리워서.
시가 사라진 시대에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저자는 말한다. 그들은 슬픈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치이고 외면당해서 고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만이 시를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이다.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존재조건을 부정해보지 않고 이 세계의 틈이나 구멍, 혹은 숨은 질서나 그림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저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 한명희는 「이방인」에서 이렇게 말한다.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마흔 살 나는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었다고. 엉뚱한 곳에서 이방인의 말을 하고 있었다고. 또 시인 황지우는 「거울에 비친 괘종시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 이번 生은 베렸어. 다음 세상에선 이렇게 살지 않겠어. 이 다음 세상에선 우리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시인들은 세상에 실연당한 채 언저리에서 세상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따위 세상은 저버리고 고고하게 살아가는 건 어떨까? 하지만 것도 녹록지 않다. 우리에게는 먹어야 산다는 치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한다. 인간도 여느 동물과 다름없이 먹어야 산다는 엄중한 이치, ‘만물의 영장’에서 한낱 ‘벌레’로의 전락, 쉽게 말해 먹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치욕은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시가 사라진 시대에 시를 쓰는 시인들은, 세상에서 버려지고도 끝없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시인들은 어디에 몸을 뉘일 수 있을까?
시가 시인을 위로한다.
시가 당신을 어루만진다.
저자는 문학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문학은 부정을 통해 환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현실을 추문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기의 운명이나 존재 조건을 기꺼이 인정하고 껴안음으로써 힘없이 처진 어깨를 다독이고 쓰라린 고통의 상처를 위무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는 우리에게 속삭여준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잘했다고. 흐르는 눈물 흐르는 피 그냥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한명희, 「상담 - 소영에게」) 누구나 한 번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힌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고, 아무리 울어도 슬픔이 가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저자는 차라리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개인적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긍정의 힘인 것을. 슬픔도 힘이 된다고 했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시인이자 평론가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시가 사라져간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가 있어 오늘도 우리는 실컷 울고 실컷 웃는다.
“이렇게 슬픔을 긍정하기까지,
그것이 어떻게든 늘 짊어지고 가야 할 ‘질통’ 같은 자기의 운명임을 인정하기까지,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또 비가 왔을 것이다.”
시인의 고집과 비평가의 난해함을 잠시 벗어 던진, 한 중년의 사내가 시를 말한다.
시는 슬프다. 당신이 그리워서.
“지금은 사라진, 홍대 앞 카페 ‘예술가’에서 한 시인이 그랬다. 시의 시대는 갔다고.” 이 책은 위 문장으로 시작된다. 시를 들려주는 에세이가 시가 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의 출발점은 현실 직시가 아니겠는가. 시도 눈물을 머금고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트위터는 시처럼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구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각종 영상 매체는 시보다 더 쉽게 더 감각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러니 어려운 시는 더 이상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고. (김소월, 「먼 後日」 변용) 그러니까 끝끝내, 먼 훗날 당신이 찾기 전까지 시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는 것이다.
시인은 슬프다. 세상이 그리워서.
시가 사라진 시대에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저자는 말한다. 그들은 슬픈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치이고 외면당해서 고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만이 시를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이다.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존재조건을 부정해보지 않고 이 세계의 틈이나 구멍, 혹은 숨은 질서나 그림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저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 한명희는 「이방인」에서 이렇게 말한다.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마흔 살 나는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었다고. 엉뚱한 곳에서 이방인의 말을 하고 있었다고. 또 시인 황지우는 「거울에 비친 괘종시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 이번 生은 베렸어. 다음 세상에선 이렇게 살지 않겠어. 이 다음 세상에선 우리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시인들은 세상에 실연당한 채 언저리에서 세상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따위 세상은 저버리고 고고하게 살아가는 건 어떨까? 하지만 것도 녹록지 않다. 우리에게는 먹어야 산다는 치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한다. 인간도 여느 동물과 다름없이 먹어야 산다는 엄중한 이치, ‘만물의 영장’에서 한낱 ‘벌레’로의 전락, 쉽게 말해 먹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치욕은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시가 사라진 시대에 시를 쓰는 시인들은, 세상에서 버려지고도 끝없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시인들은 어디에 몸을 뉘일 수 있을까?
시가 시인을 위로한다.
시가 당신을 어루만진다.
저자는 문학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문학은 부정을 통해 환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현실을 추문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기의 운명이나 존재 조건을 기꺼이 인정하고 껴안음으로써 힘없이 처진 어깨를 다독이고 쓰라린 고통의 상처를 위무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는 우리에게 속삭여준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잘했다고. 흐르는 눈물 흐르는 피 그냥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한명희, 「상담 - 소영에게」) 누구나 한 번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힌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고, 아무리 울어도 슬픔이 가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저자는 차라리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개인적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긍정의 힘인 것을. 슬픔도 힘이 된다고 했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시인이자 평론가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시가 사라져간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가 있어 오늘도 우리는 실컷 울고 실컷 웃는다.
“이렇게 슬픔을 긍정하기까지,
그것이 어떻게든 늘 짊어지고 가야 할 ‘질통’ 같은 자기의 운명임을 인정하기까지,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또 비가 왔을 것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프롤로그; 사라진 예술가, 남은 절벽
1; 외설적 아버지의 명령, “즐겨라!”
이 숨찬 경쟁의 피로, 어떻게 푸나
내 안의 슬픔을 긍정하기까지
외설적 아버지의 명령, “즐겨라!”
도시의 속도를 비추는 지하철 정거장의 시
과학보다 더 뛰어날 미래의 시
자본의 질량에 얹혀 질주하는 ‘미래파’의 운명
인지과학, 영성靈性, 현대시
2; 여러분의 ‘그것’은 안녕하신가요?
한 플라톤주의자의 비극 -김소월, 「먼 後日」
“갈매나무라는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석, 「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우리들 마음에 도둑이 들었다 -성찬경, 「다이아몬드의 별」
여러분의 ‘그것’은 안녕하신가요? -안도현, 「가련한 그것」
자멸파의 정념 -이영광, 「동해 2」
다만 그냥 놀자는 것뿐인데 -이수명, 「시작법詩作法」
인생은 사무치는 모순 -서상영, 「꽃범벅」
쓸쓸한 자기애의 늪 -하정임, 「즐거운 골목」
3; 나쁜 남자 VS ‘나쁜 소년’
뻐끔뻐끔 항문으로 말하는 사람들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투구 안에 흐르는 눈물 -한명희, 『내 몸 위로 용암이 흘러갔다』
그림자와 벌이는 위험한 연애 -김소연,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먹어야 산다는 치욕 -김기택, 『껌』
나쁜 남자 VS ‘나쁜 소년’ -허연, 『나쁜 소년이 서 있다』
얼마나 오래도록 마음을 타고 놀았으면 -장정자, 『뒤비지 뒤비지』
욕망의 연금술 -최명선, 『기억, 그 따뜻하고 쓰린』
내 쪽으로 죽음을 끌어당기는 이유 -김초혜, 『고요에 기대어』
어느 날 그는 어머니 묘지에 앉아 있을 거다 -황지우, 『어느 날 나는 흐린 酒店에 앉아 있을 거다』
4; 밥과 어머니 또는 보살핌의 윤리
영원한 어린이의 눈, 마이너리티의 슬픔 -김상미의 시
정처 없는 이 발길 -정병근의 시
저 푸른 초원 위에, 섬뜩한 숭고 -김선태의 시
밥과 어머니 또는 보살핌의 윤리 -상희구의 시
기다림의 힘, 견딤의 아름다움 -윤은경의 시
응시와 죄의식 -이창희의 시
1; 외설적 아버지의 명령, “즐겨라!”
이 숨찬 경쟁의 피로, 어떻게 푸나
내 안의 슬픔을 긍정하기까지
외설적 아버지의 명령, “즐겨라!”
도시의 속도를 비추는 지하철 정거장의 시
과학보다 더 뛰어날 미래의 시
자본의 질량에 얹혀 질주하는 ‘미래파’의 운명
인지과학, 영성靈性, 현대시
2; 여러분의 ‘그것’은 안녕하신가요?
한 플라톤주의자의 비극 -김소월, 「먼 後日」
“갈매나무라는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석, 「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우리들 마음에 도둑이 들었다 -성찬경, 「다이아몬드의 별」
여러분의 ‘그것’은 안녕하신가요? -안도현, 「가련한 그것」
자멸파의 정념 -이영광, 「동해 2」
다만 그냥 놀자는 것뿐인데 -이수명, 「시작법詩作法」
인생은 사무치는 모순 -서상영, 「꽃범벅」
쓸쓸한 자기애의 늪 -하정임, 「즐거운 골목」
3; 나쁜 남자 VS ‘나쁜 소년’
뻐끔뻐끔 항문으로 말하는 사람들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투구 안에 흐르는 눈물 -한명희, 『내 몸 위로 용암이 흘러갔다』
그림자와 벌이는 위험한 연애 -김소연,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먹어야 산다는 치욕 -김기택, 『껌』
나쁜 남자 VS ‘나쁜 소년’ -허연, 『나쁜 소년이 서 있다』
얼마나 오래도록 마음을 타고 놀았으면 -장정자, 『뒤비지 뒤비지』
욕망의 연금술 -최명선, 『기억, 그 따뜻하고 쓰린』
내 쪽으로 죽음을 끌어당기는 이유 -김초혜, 『고요에 기대어』
어느 날 그는 어머니 묘지에 앉아 있을 거다 -황지우, 『어느 날 나는 흐린 酒店에 앉아 있을 거다』
4; 밥과 어머니 또는 보살핌의 윤리
영원한 어린이의 눈, 마이너리티의 슬픔 -김상미의 시
정처 없는 이 발길 -정병근의 시
저 푸른 초원 위에, 섬뜩한 숭고 -김선태의 시
밥과 어머니 또는 보살핌의 윤리 -상희구의 시
기다림의 힘, 견딤의 아름다움 -윤은경의 시
응시와 죄의식 -이창희의 시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